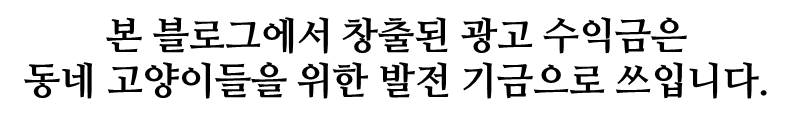
그 일이 있고 나서, 당분간 나는 고양이를 본 적이 없다. 아니, 봤어도 못 본 척하며 일부러 다른 길로 갔다. 더 이상 고양이를 무서운 존재로 기억하고 싶지 않았다. 외할아버지 댁에서 살던 고양이들처럼, 햇볕을 내리쬐며 따뜻함을 보유한 고양이로 기억하고 싶었다.
몇 년이 지나, 내가 다니던 독서실 건물 1층에 위치한 약국 앞에서 고양이가 밥을 먹고 있었다. 무려 4년을 넘게 다녔던 독서실인데... 고양이가 있었다니... 4년 동안 이 근방에서 고양이를 본 적이 없어서 충격이 꽤나 컸다... 약국 문 앞에서 밥을 먹고 있던 녀석은. 배달 오시는 기사님, 약 사러 오시는 손님들은 무시하지만 자기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내가 꽤나 신경이 쓰였나 보다. 몇 번이고 나를 째려보더니, 묵묵히 밥을 먹었다.


밥 먹는 고양이를 쳐다보고 있으니, 약사 선생님께서. "이름은 흰 코, 수컷이야. 쓰레기를 뒤지고 있던 녀석인데 한 번 밥을 주니, 시간만 되면 밥을 먹으러 오더라고. 내가 일하느라 늦으면 밥을 달라고 야옹~하고 울어. 어찌나 똑똑한지. 길에서 태어난, 일명 길고양이들은. 촌이면 또 몰라. 도시에는 이 녀석들이 먹을 게 없어. 그래서 쓰레기 뒤지면서 하루를 연장하며 사는 애들이 많지. 사실 밥 주는 거부터 시작하면 이 아이들이 쓰레기를 뒤지지도 않아서 고양이에 대한 편견 같은 소리를 들을 일도 줄어들고, 누가 뭐라 하면 내가 밥 주는 아이라고, 내 고양이라고 보호해줄 수도 있고." 하시는 말씀에, 고양이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고양이"라는 존재가, 도시에서도 보호받으며 살 수도 있구나. "고양이"라는 존재를, 도시에서도 보호해 줄 수 있구나. 이내 무섭다는 생각보다 나도 보호해주고 싶다, 보호해줘서 저번에 마주쳤던 고양이처럼 보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더 컸다. 그런 생각이 단번에 내 마음속으로 들어왔다. 그때부터였다. 이상하게 10년 넘게 살았던 우리 아파트에서 보지 못했던 고양이들이 보이게 시작한 게. 우리 동네에 사는 고양이가 어떤 삶과 사연을 갖고 살아가는지 궁금한 게.
그래서 시작했다. 동네 고양이 밥 주기.
단지 길에서 산다고 불리는 길고양이보다는 우리 동네에서 같이 산다는 의미에서 동네 고양이로 인식을 한번 바꿔보겠다는 결심을 했다. 고양이들에게 밥을 주기 전에 고양이가 먹어야 하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하는 음식도 검색해보고, 다른 동네에서는 고양이들을 어떻게 보호해주는지 궁금해서 찾아보았다. 지금 활동하고 있는 연대는 그때 당시 없어서 다른 의회에서 활동했다. 하지만 연대의 품앗이, 대표님의 꼼꼼함 그리고 더 많은 고양이에 대한 정보 공유에 매료되어 지금은 연대에서 활동 중이다. 연대에서 꾸준히 활동을 해서 여러 활동가분들의 도움을 받아 지금의 급식소와 지금의 동네 고양이들을 보호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혼자서 하는 것보다 여럿이서 하면 좋다는 게 이런 건가.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나는 고양이로 만나는 인연들은 좋았다. 고마워, 동네 고양이들아.
'고양이와 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사실, 나는 고양이가 무서웠다. (0) | 2020.10.20 |
|---|